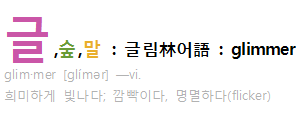고독이 희석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와 자주 연락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 혼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던 시대에서 혼자 글을 쓰지만 빠른 응답을 원하고 다른 누군가로부터의 반응을 바로 받거나 협업을 하거나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뭔가를 만들고 지어내는 것은 혼자라서야, 그 창작의 근원이 분명해지는 것이다. 삶도 비슷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의존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의 삶의 가치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외로움을 원하고 또는 외로움을 원하지 않는다.
그 희석된 고독(외로움과는 구분되는 자아와의 대면)의 시대에 외로움과 고독이 혼재된 시대에 살면서 아주 약한 것들이 보내는 신호들에 주목해 본다. 예를 들어 꽃이 핀다거나 잎이 난다거나 하는 봄에 그것들이 보내는 신호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삶의 보호벽이거나 하는 것들일 텐데, 자연에서 그 존재를 인식하는 주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외로움에 대한 신호, 그것은 사랑의 부재에 대한 소리이거나 색깔이거나 움직일 수 있다.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을 아름다이라고 한다면, 세상은 전혀 아름답지 않지만, 아름다워지기 위해 또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위해 작동하는 뭔가가 있다. 고독이 희석된 시대, 그 제자리에 돌려놓거나 만들어내는 힘이 고독이라면 자발적 고립이 나쁘지만은 않겠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
이른 아침부터 가까운 커피집에 들렀고 혼자 담배를 한 대 태웠고 애기똥풀의 그 노란빛을 보다가 숙소에 올라와 일과를 준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지겹다라고 생각한 어느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