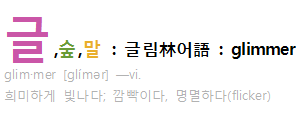양귀자의 소설 중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이라는 제목이 있다. 이 제목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일은 일상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에서, 혹은 엄격한 윤리적인 문제에서 더욱 그렇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흰색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 과학적 논리에 따르면 어떤 색도 없는 것을 의미한다. 검정색이 모든 색의 혼합인 것처럼. 흰색을흰색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모순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도덕이나 윤리에 따른 어떤 규칙은 여전히 흰색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제약하는 일을 만들어 낸다. 그렇게 당위적인 모순이라는 것을 직감할 때마저, 그 굴레에서 생각의 경계를 넘나들기마저 쉽지만은 않다.
그런 사고의 연쇄가 행동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수도 있다. 이제 일반적인 도덕과 비도덕의 사이에서의 갈등과 방황을 일시에 소거할 수 있는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인 가정을 하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행동까지의 거리적 제약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것은 어찌보면 인정함으로써 일차적인 해결을 거둘 수도 있다. 인정함이 있으면 행동도 사고도 제약을 넘어서 다른 행위의 여지를 확보하게 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다.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일까. 그렇게 인정하는 것도 행동의 시작점이 되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흰색은 흰색이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고,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고들은 지속적이고 해결되지 못하는 일련의 숙명의 선택처럼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라면 흰색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선인지, 선택의 우선의 문제인지 선제적인 행동의 문제가 선택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인지조차도 고난한 고민의 시작이다.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