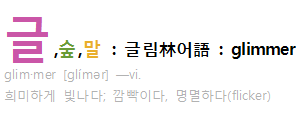모두에게 공감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눈이 내린다고 좋아하거나 낙엽을 보고 우울해 하는 일 따위는 누군가에게 거북함일 수 있고 과잉반응일 수 있다. 눈은 시련이나 차가움이고 낙엽은 우울함이나 고독함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강요당한 나머지 다른 어떤 상상을 하기에는 현실의 손맥이 너무 쎄다. 그렇다고 우리가 감정에 지쳐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그것을 피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다른 감정을 일부러 소유하는 일 따위도 사실 번거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다르다는 것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유전자를 더 안전하고 더 낫게 하려는 무의식이 있다. 자신의 유전자, 즉 가족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에 과도한 애착을 느끼는 것은 그런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는 자신에게 부족한 무엇인가를 본능으로 찾아내고, 이를 관계의 형태로 묶어두려고 할 텐데, 이런 이름이 바로 친구라고 할 수 있다. 다르다는 것을 싫어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미워하는 것은 그것의 회피와 동화를 동시에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많이 미워하면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친구라는 것은 그런 오랜 유전자의 인내와 유전자의 탐욕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연민이거나 혹은 공감이거나.
연민과 공감은 모두 상대방의 감정에 동조하는 감정의 변화 현상이다. 그런데 연민은 상처와 네거티브를 치유하기 위한 자연적인 치유 감정의 하나라고 한다면, 공감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이끌어내는 감정의 변화다. 하지만 이런 연민과 공감을 별도로 작용하지 않는다. 연민은 공감이고 공감은 연민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어떤 대상에게 친구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이중적인 일이어서 상당한 조심을 필요로 한다. 그만큼의 상처를 공유하거나 반감을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눈이 내려서 지랄이라거나 낙엽이 떨어지니 기운이 난다는 사람을 만나고 싶기도 하다.
스스로의 과오에 대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지만,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 삶이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내 유전자의 작용이 어디까지일지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을 넘기고 또다른 오늘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마저도 부정적이고 다름이라는 이유로 유전자의 틈을 메꿀 수 있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