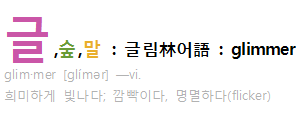삶은 극복되는 것이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라는 말처럼 허망한 말도 없다.
삶에서의 행복은 고통을 떨치거나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다.
무뎌지는 모든 것은 지혜롭다.
이러한 교수취임논문의 내용을 조금 수정하여 보충하려던 칸트는 이 논문의 중요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반성을 시작하게 된다. 1772년 2월 21일 칸트는 교수취임논문 공개 발표 때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제자 ‘헤르츠’(Marcus Herz)에게 편지를 보내 그간의 생각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알리게 된다. 이 편지에서 칸트는 ‘우리의 표상이 대상과 관계 맺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는가?’라는, 이전의 형이상학적 연구들이 소홀히 했던 본질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이 문제에 답하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의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칸트는 어려서부터 허약체질이었지만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관리로 강의, 연구, 저술 활동을 별 어려움 없이 이어갈 수 있었다. 그가 하루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각에 산책에 나섰기 때문에, 쾨니히스베르크 시민들의 산책하는 칸트를 보고 시계의 시각을 맞췄다는 얘기, 그런데 장 자크 루소의 [에밀]을 읽느라 단 한 번 산책 시간을 어겼다는 전설은 유명하다.
1799년부터 크게 쇠약해진 칸트는 1804년 2월 12일 늙은 하인 람페에게 포도주 한 잔을 청해 마시고 “좋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쾨니히스베르크 시 전체가 휴무에 들어갔고 운구 행렬에 수천 명이 뒤따랐으며 시내 모든 교회가 같은 시간에 조종(弔鐘)을 울렸다. 철학자 칼 포퍼는 이에 관해 [추측과 반박]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1804년 프리드리히 빌헬름의 절대왕정 치하에서 칸트의 죽음을 애도한 그 많은 교회의 종소리는 미국 혁명(1776)과 프랑스 혁명(1789)의 이념이 남긴 메아리였다. 칸트는 고향 사람들에게 그 이념의 화신이었다. 인간의 권리와 법 앞의 평등, 세계 시민권과 지상의 평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식을 통한 인간 해방을 가르친 스승에게 고향 사람들은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몰려왔다.”